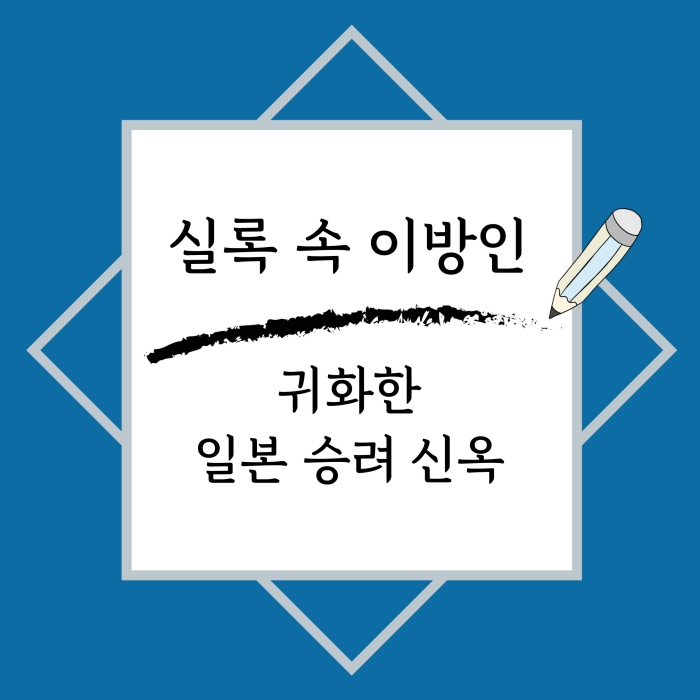1497년, 연산군 재위 3년. 어느 날 조정의 가장 중요한 전각인 '인정전'에 뜻밖의 손님 세 마리가 출현합니다. 바로 양이었죠. 오늘은 연산군과 '양 세 마리 사건'에 얽힌 실록 기록을 살펴보며, 조선 궁궐 속 아주 엉뚱한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1. 오늘의 실록 기록 양 세 마리가 풀어져 인정전(仁政殿)에 들어왔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전정(殿庭)은 조정 백관이 우러러 보는 곳이요, 양을 기르는 곳은 따로 있는데, 맡아 지키는 자가 조심하지 않아 놓여 나오게 하였으니, 통절하게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양을 알지 못하므로 보려고 한 것이다." 하고, 곧 명하여 놓아 주었다. -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군 3년 5월 17일 (음력) 2. 실록 현대어 해석 및 요약 ..